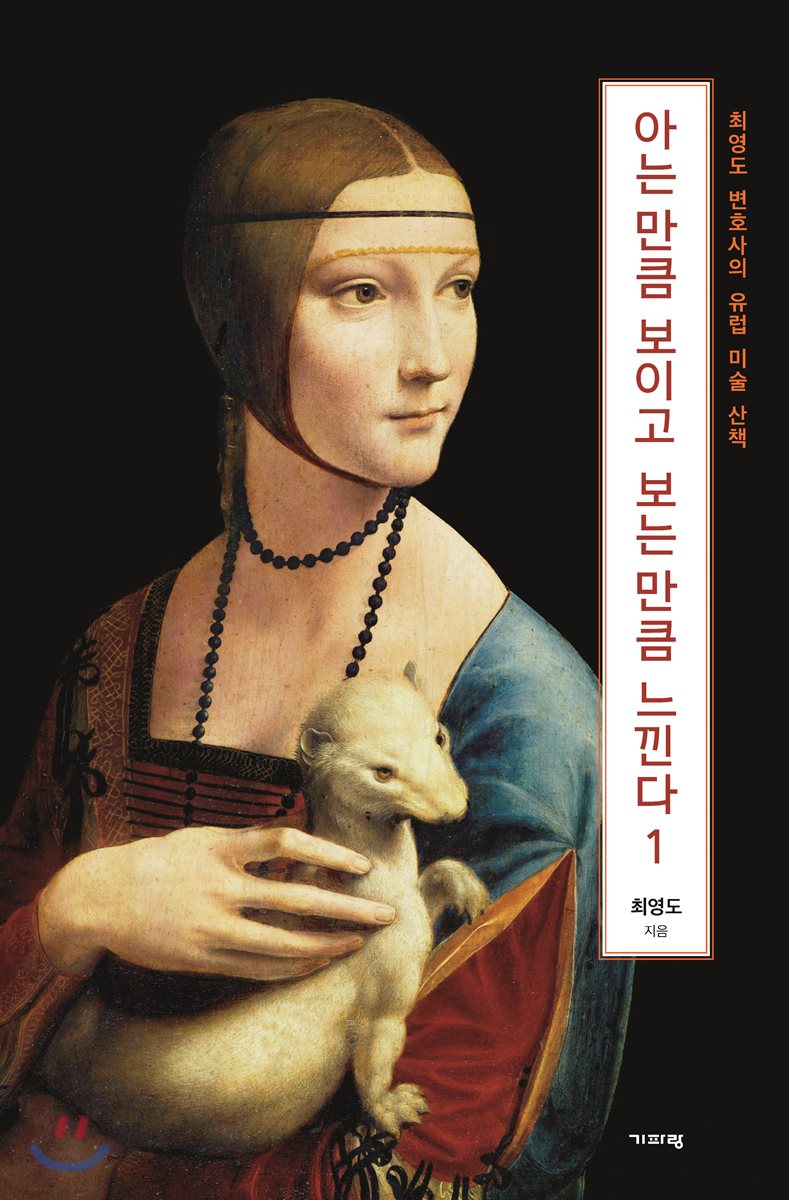남을 돕고 싶었습니다. 처음 시작했을 때의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. 호텔을 나간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허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오해를 받았습니다.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세속적이라고 내 얼굴에 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32살에 쓴 단편소설 ‘순신’에서 밝혔듯이, 저는 이미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시시포스처럼 무너질 산 위로 바위를 밀어올리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. 쉬운 일이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. 재밌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.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. 회사를 닫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,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내 인생에 엉터리 철학이 있었던 탓인지,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로 돌아갔다.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. 시지프스와 다를 바 없었다. 시지프스 같아서 싫은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, 남들 눈에는 시지프스처럼 보였다. 현실은 결과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의미 없는 짓을 계속하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만 보인다. 그러는 사이에 내 어린 시절의 세상을 만든 소중한 사람이 나를 떠났다… 그렇다… 바보 같은 짓이었다… 눈을 뜬 채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다. 의미… 내 꿈은 아버지의 꿈이었고, 초등학교만 나와 늘 낡은 운동화를 신던 부모님이 여기까지 오는 데 필요한 돈을 사실상 주었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다.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사랑이었다. 의미가 아니었다.